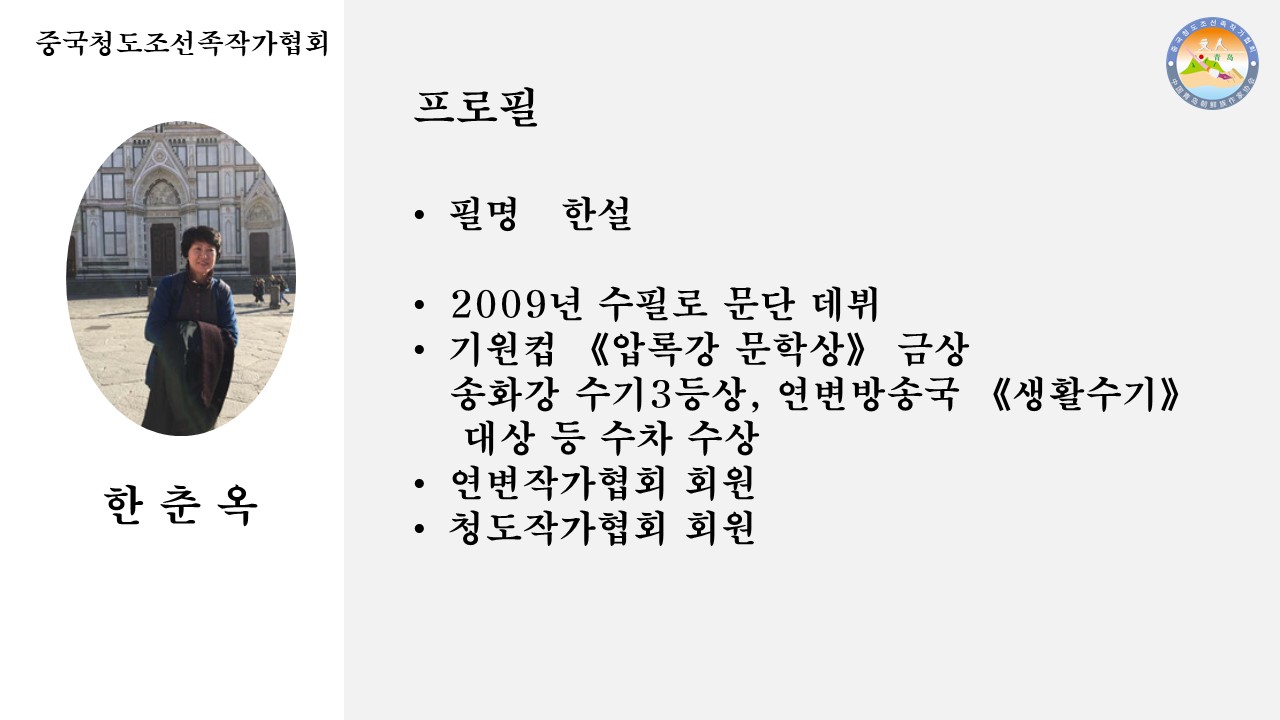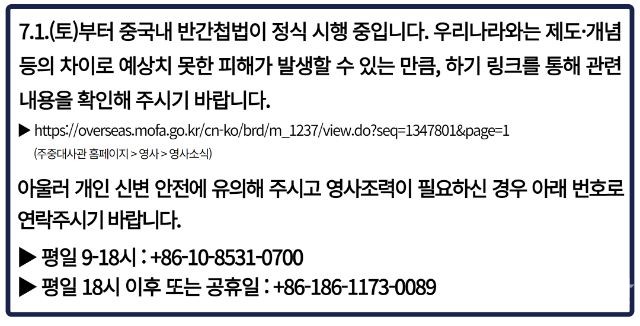|  |  |  |  |
김치움에 항아리
한춘옥

김치움에 항아리
요즘은 집집마다 먹거리 저장고를 주방에 모셔놓고 있다. 집주인과 키돋음하는 고풍스러운 창고에 먹거리를 전시장처럼 차려놓는다. 가족들은 문고리만 잡으면 간식을 먹을 수 있다. 주먹만한 위에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을 쏟아 넣으니 저마다 올챙이 몸매를 자랑한다. 영양과잉이란 현대사치병이 받들어준 선물이라 하겠다.
냉장고의 원조는 김치움이다. 인공자연 김치움은 친환경 인생을 살아온 조상들의 지혜다. 흙으로 빚은 이 냉장고는 자연의 맛을 살리고 육식보다 야채를 위주로 하는 식단을 주장했다.
옛날에는 움막집 같은 김치 저장고를 쓰면서 몸을 많이도 움직였다. 집집마다 아버지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세대주의 힘자랑을 하였다. 좋은 자리를 정하고 흙을 한 삽, 한 삽 파낸다. 크기는 안방만하게, 깊이는 2미터를 파고 뚜껑을 통나무와 흙으로 잘 덮는다. 출입을 할 수 있게 문과 사다리까지 마련한 천연냉장고를 시원하 게, 멋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김치움은 겨울에 김치가 얼지 않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땅속이라 냉장고처럼 선들선들하다. 진짜 김치움은 전기가 필요없 는 자연 냉장고다.
언제나 가족과 함께 일을 하면서 사랑과 정을 쌓았던 그 시절 김치움은 우리의 복된 살림의 활력소였다. 늦가을이면 김장독은 김치움에서 매운 고집과 비린 편견을 삭히고 봄이면 앞마당에서 햇빛으로 사람 사는 끈끈한 정을 녹인다.
해마다 가을이면 엄마들은 갖가지 야채 장만에 바쁘시다. 입동을 기준으로 십여 가지 김장을 한다. 영채와 갓은 노랗게, 예쁘게 띄운다. 배추와 무우, 파는 곱게 다듬어서 소금물에 맞춤초절이를 한다. 꼬마들도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늘도 까고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한다. 일이 사랑이라고 배웠으니 지금 아이들처럼 공주병사치를 누릴 수 없었다.
엄마는 찧고, 볶고, 끓이며 맛내기 같은 양념을 만들어서 배추포기에 곱게 옷을 입힌다. 이웃들이 서로 도우면서 김장을 하고 시식을 해본 다음 김치 맛을 평가하기 도 한다. 조부모님들이 갖가지 김치맛과 멋을 그대로 살리고 “바로 이 맛이다!” 라고 하면서 엄마는 그 미묘한 손맛을 긍정하셨다.
갖가지 김치를 버무리고 나서 김치움에 앙상블타입의 항아리를 기윽자로 쭉 배열을 한다. 김장을 김치독에 차고차곡 넣고나면 오종종한 항아리는 서로 맞대고 자신이 담고 있는 맛을 익힌다.
이어서 감자, 무우, 당근을 모래에 묻어놓고 배추까지 배열한다. 김치움은 풍성한 살림집 같이 아담하고 고풍스럽다. 싱싱한 채소와 과일은 김치움에서 지기를 받아 맛이 달콤래진다.
한겨울 먹거리를 김치움에 넣고 나면 어른들은 성취감을 느끼며 즐거워 하셨다. 올해 겨울준비 다했으니 보글보글 맛있게 지지고 볶고 끓일 일만 남은 것이다.
사랑을 듬뿍 넣어 담근 “엄마표 김치”는 아버지께서 땀 흘려 만드신 김치움에서 맛있게 곱게 익는다. 숙성이 잘된 배추김치, 빨갛고 하얀 속살을 손으로 쭉쭉 찢어 입에 넣으면 쨍하면서도 톡톡 쏘는 그 맛이 별미다. 냉장고김치 울고 갈 그 깊은 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사람 사는 동네맛, 그 싱그럽고 맑은 순수함이 참 좋았다. 한겨울 지나 봄이면 누구 집에 김치움 항아리가 바닥났다고 하면 바가지에 푸짐하게 담아주던 그런 인심이 얼마나 좋았던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참으로 네것 내것없이 서로 나누고 도우면서 살았었다.
김치움의 정취는 지금도 나의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있다. 밖에서 뛰놀다가 컬컬 하면 김치움에 뛰어 들어간다. 개발 같은 손으로 돌배 한 알 찾아 바지에 썩썩 닦아 목을 축인다. 김치잎을 찢어서는 입에 고추를 벌겋게 잔뜩 바르면서 먹어댄다. 옷자 락으로 입가를 쓱 닦고는 김치움에서 나온다.
집에 손님이 오거나 명절이 다가오면 김치움에 자주 들락거린다. 엄마는 나에게 항아리를 가리키며“ 이 속에는 갖가지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지!” 라고 하면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달랬다.
우리 조상들은 인생살이 고개고개를 묵은지처럼 잘도 발효를 시켰다. 나는 항아리마다 소복히 담긴 삶의 이야기를 듣고 먹으면서 자랐다.
엄마는 반들반들하게 항아리를 닦으면서 살림은 알뜰하게 야무지게 하는거라고 타일렀다.
요즘은 김장도 하지 않고 가을인지, 겨울인지 계절을 착각할 정도로 푸른 야채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음식에 고명까지 장식을 더해가면서 입만 아닌 눈과 코로 먹는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김치움에 항아리 김치맛이 그립다. 온몸을 짜릿하게 하고 땅의 기를 그대로 받는 그 시원하고 매콤한 맛이 그래도 제격이고 일품이다. 냉장고의 딱딱한 맛에는 전혀 김치움의 따뜻한 인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요즘은 구경도 할 수 없는 김치움인데 그 맛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자연이 빚어내고 어머니의 정성이 곁들어진 김치움에서 건져낸 김치를 오손도손 모여앉아 손으로 쭈쭉 찢으며 실실거리면서 먹던 그 정취가 그립다.
<<송화강>>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