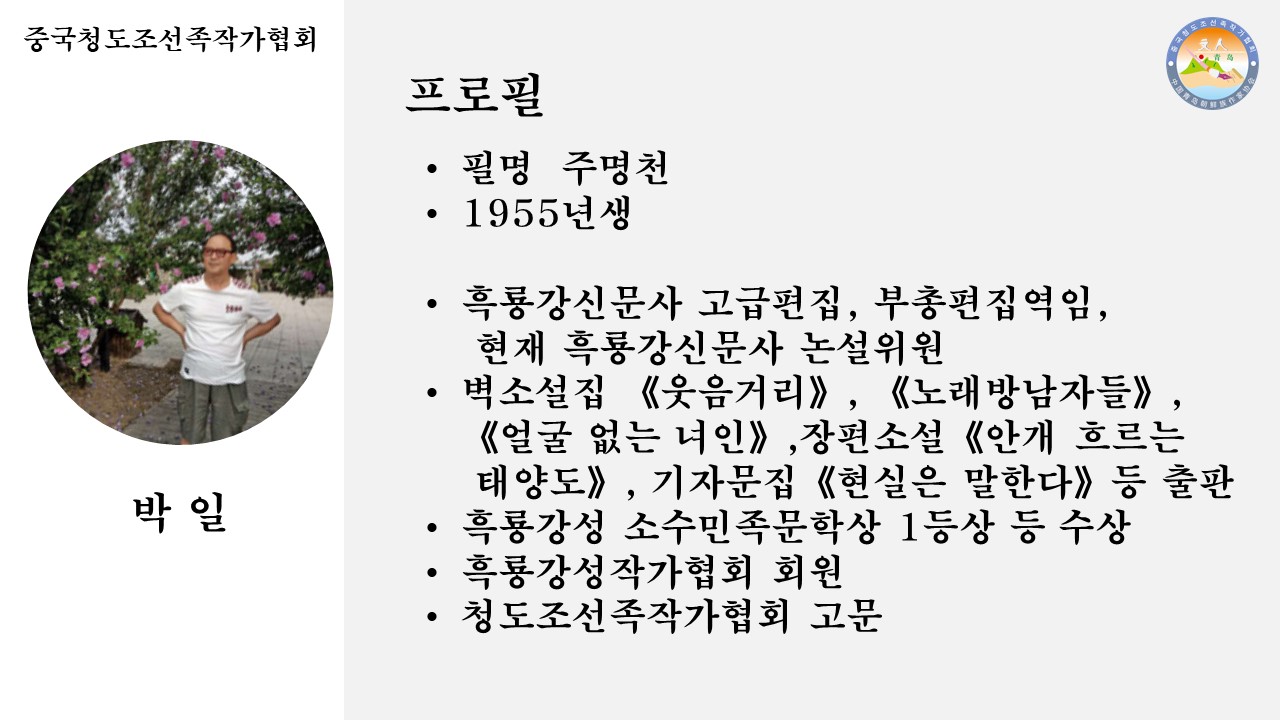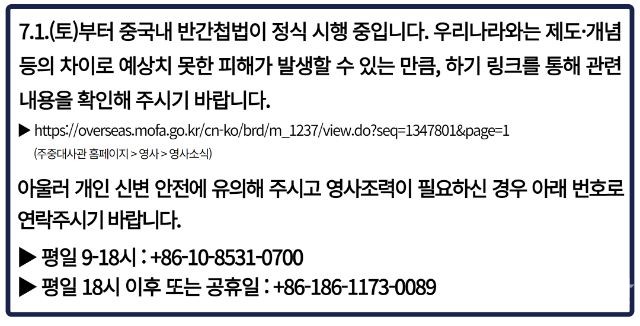|  |  |  |  |
고영감과 혹덩이
박일

고영감과 혹덩이
인삼골 마을에 사는 고영감은 참으로 애매하기 그지없는 신체장애인이었다. 보통 체격에 오관이 바로 들어앉고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온천한 사람들과 비해보면 어느 한곳도 모자라는데라곤 없는 그는 딱 머리와 몸뚱이를 이어놓는 그 가드다란 목 오른켠에 어린애주먹만한 고기덩어리가 하나 더 붙어있었던 것이다. 마을사람들은 남들보다 고기 한점 더 붙은 그 혹덩이가 희한해서 그랬던지 아니면 병신이라고 기시해서 그랬던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이름대신 언제나 “혹”자를 붙혀서 불렀다. 그가 어릴적에는 “혹불 아이”라고 불렀고 그가 커서는 또 “혹불 총각”이라고 불렀고 그가 중년이 되었을 때는 맞춤한 뒷명사를 찾지못했던지 “혹불 양반”이라고 부르더니 이젠 그가 늙으니 한입처럼 “혹불 영감”이라고들 부르고 있었다. 그래서 누구든 인삼골 마을에 와서 고아무개를 찾는다고 하면 도리를 저을 사람이 많을지 몰라도 목 한쪽에 혹이 달린 사람을 찾는다고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른 애꿎은 혹은 한생 고영감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놓았다. 젊은 한시절 그는 밉살스러운 그 혹을 감춰보려고 옷깃을 남달리 길고 크게 만들어 옷깃으로 목을 슬쩍 감추고 다니기도 하였고 무더운 여름철 속적삼바람으로 일을 할 때면 또 불룩 튀여난 목에다 노란수건을 꽁꽁 동여매기도 했었다.
그렇게 괘씸한 혹 때문에 그는 성격도 완전히 변해버렸다. 어린시절엔 엉덩짝을 드러낸 계집애들까지도 “혹달리개”라고 놀려주는 통에 차츰 같은 또래들과 휩쓸려 다니길 꺼려하였는데 머리가 크면서부터는 혼자서 자기하고만 노는 것이 철같은 습관으로 굳어져버렸다. 그는 운동구경이나 영화관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엔 절대 얼굴을 내민적이 없었고 꾹 다문 입은 바위처럼 무거워서 누구하고든 상대에서 묻지 않으면 절대 먼저 말을 꺼낼줄 몰랐다. 그랬으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소리는 고사하고 휘파람소리조차 들어본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한생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아온 그는 한쪽다리를 심하게 절는 아내를 맞아 무남독녀 귀여운 딸 하나 낳아서 키웠는데 그 딸이 공부를 잘해 대학을 나오고 박사까지 졸업했다.
어느날 집으로 온 딸이 혹불 영감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전 이번엔 아빠를 모시러 왔어요.”
“... ...”
“내일 당장 저와 함께 상해로 떠납시다요.”
“... ...”
“제가 알아보았는데 상해의 병원에선 아빠 목에 있는 그 혹을 얼마던지 뗄수있다고 해요.”
“어엉?...”
그 소리에 영감이 펄쩍 뛴다.
“너 방금 뭐라했노?”
여직껏 꿀먹은 벙어리처럼 딸애가 하는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영감이 혹을 뗀다는 소리에 벌커덕 놀란다.
어찌 그러지 않으랴!
(이 혹만 없다면... 이 혹만 없었더라면...)
그는 철이 들어서부터 자나 깨나 이한 생각을 몇백번 아니, 몇천번 신물이 나도록 했었는지도 모른다. 그 혹덩이가 밉살스럽기 그지없고 그래서는 분하고 원통한 나머지 날카로운 손톱으로 혹덩이를 사정없이 뜯어놓아 살덩이가 아니라 피덩이를 만들어놓은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지지리도 무거운 혹에 눌리워 한생을 기죽어 살아왔으니 그의 귀에 혹을 뗄수있다는 그 소리야말로 세상에서 처음 듣는 반가운 소리가 아니었겠는가.
이튿날 고영감은 딸과 같이 상해로 혹떼러 떠나갔다. 며칠이 지나니 아니나 다를가 고영감은 어머니배속에서부터 찰거마리처럼 붙어나와 한생을 지꿎게 애먹이던 그 혹덩이를 시원 섭섭하게 훌 떼던지고 거뜬한 몸으로 마을로 돌아왔다.
(이제부터야 어떤 놈이든 더는 ‘혹불 영감’이란 소릴 하지 않겠지?! 그래, 인젠 내일 죽어도 눈을 감을수 있겠노라!)
혹을 뗀 목을 만지고 또 만지고 더듬고 또 더듬어 보는 고영감은 기분이 좋아 날것만 같았다.
“내 그 놈의 혹을 떼버렸수다!”
“이 목을 좀 만져보슈, 여기를 말이우다!...”
고영감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혹을 떼고 돌아오던 그날 저녁부터 수술자리를 봉한 흰 붕대를 아직 풀어버리지 않은 그 맵시로 생전 발길도 가지 않던 인삼골 마을의 노인회관으로 마실을 나갔다.
하지만 맹랑하게도 고영감의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그때부터 인삼골 마을 사람들은 고영감을 보고 “혹불 영감”이라고는 부르지 않았지만 그 대신 “혹뗀 영감”이라고들 불렀던 것이다. 그러니 고영감은 죽어서도 그놈의 “혹”자만은 영영 떼어버릴수 없는 괴상한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