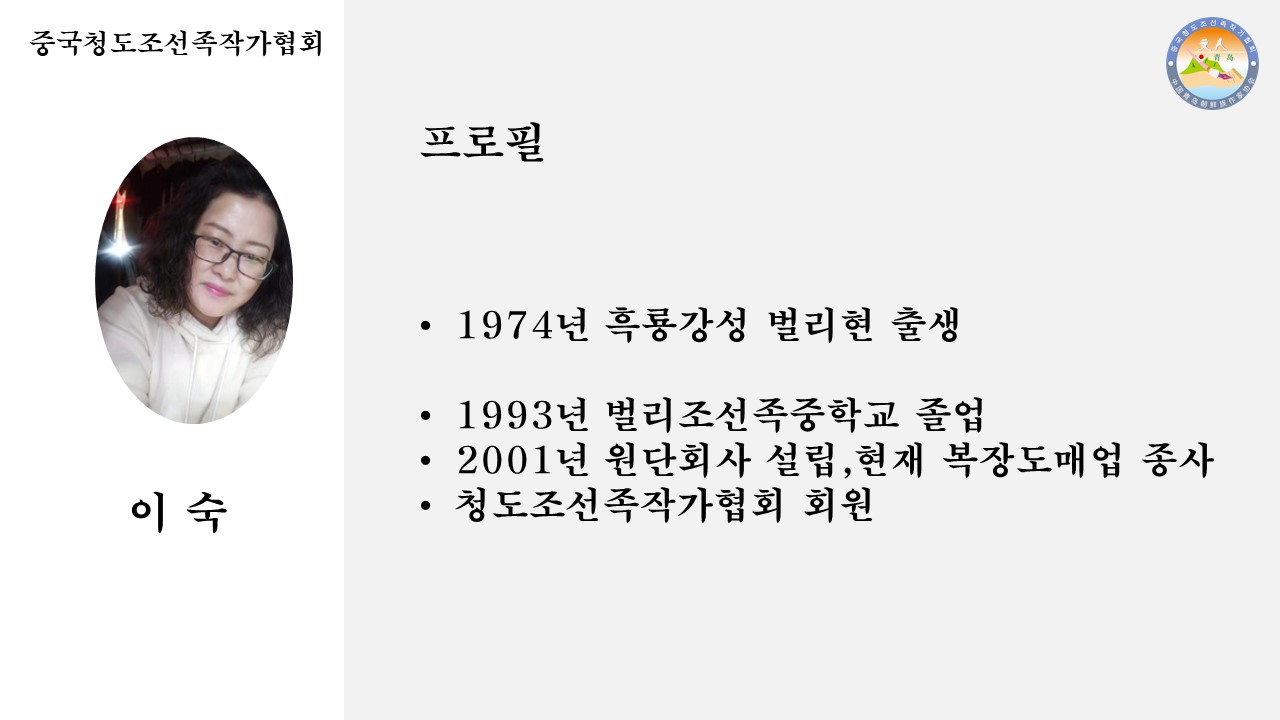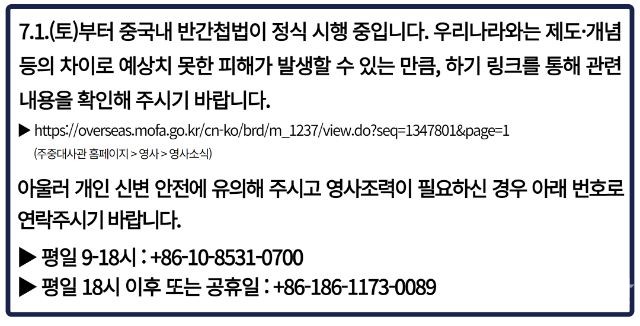타향 & 고향
이 숙

타향 & 고향
지하철역 통로에서 이런 문구를 봤다. 묘한 감정이 아련하게 스물스물 밀려온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30년 가까이 지낸 나에게 고향과 타향은 어떤 존재 였을가,
타향& 고향.
70후 인 나는 고향과 타향은 확실히 구분된다고 생각했다.
고향은 태여나서 몸이 자라는 어린시절을 보내던 곳, 타향은 고향을 떠나서 꿈을 키우고 마음이 성장하고 머무르는 곳이 아닐가 싶다.
10대 전까지 나는 갓 호도거리를 시작한 80년대 시골에서 보냈다. 항상 엄마가 해 주는 음식이 전부였고 매일 보는 한동네의 친구들과 동네사람들 외에 외부사람들과는 접촉도 별로 없었다.
학교 가는 넓디넓게 느껴지던 동구앞의 큰길, 뽀얀 먼지를 일구며 하루에 한번씩 현성에서 오가는 버스, 거기서 내리는 앞집 옆집 아주머니, 큰아버지들, 일할 때 입던 눈익은 옷이 아닌, 어딘가 어색한 새옷차림에 무엇인가 잔뜩 들어있는 커다란 가방이며 짐 보따리를 들고 내리던 풍경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간혹 친척집에 놀러 오는 이쁘장한 가방과 못 보던 소품을 지닌 시내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 그런게 일상이였다. 동네사람들 거의 모두 그러했듯이 우리부모님들도 별 고민없이 그런 환경에서 살으셨던 것 같다.
어머니는 봄에는 씨붙이를 제시간에 하려고 동이 트지도 않은 새벽부터 밭에 나가면서도 우리자매들의 밥은 꼭 챙겨놓으셨다. 여름이면 비가 많이 와도 걱정, 적게 와도 근심이였고 가을엔 잘 무르익은 곡식들을 보면서 올해는 가정기물 하나 더 마련할 수 있을 거 같다는 희망에 웃음꽃을 피웠고 겨울이 돌아오면 올 설에는 애들 셋 다 새옷 한벌씩 해줄 수 있다면서 기뻐했다.
요즘 인터넷에서 떠도는 줄임말 그대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닐 수 없다.
현성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면서 부터 나의 타향살이는 시작됐다. 학교 식당밥이 왜 그렇게 맛이 없었던지 지금 돌이켜도 입안이 쓰다. 설익은 밥에 반찬이라고는 제대로 버무려지지도 않은 막 김치뿐이였다. 한창 먹을탐이 많은 중학생 입에도 안 맞았다. 어쩌다 집에서 가져온 엄마표 짠지를 수도물에 말은 밥에 얹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 없었다. 집에서 명심해서 챙겨온 고추장에 맨밥만 그냥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기만 했었다. 참 그 땐 수도물을 그냥 받어서 마셔도 괜찮았었다.
그러다가 산동이란 낯선 곳에 오니 수도물을 그냥 먹는 사람이 없었다. 그 더운 날에도 끓여서 먹었고 광천수가 일용식수라는 걸 알게 되였다.
회사 식당에서 처음 먹었던 젓갈냄새 진한 김치찌개는 냄새부터 너무 역겨웠다. 출근하는 회사 바로 앞 옥수수밭은 뙈기도 왜 그렇게 작은지,
하는 말들은 하도 혀를 꼬아서 제대로 알아 듣지도 못했다. 회사 통역으로 들어갔는 데 고향이 함경북도인 나는 한국말도 못 알아 듣는 게 많았고 산동말도 잘 알아 듣지 못해 곤경을 치르기도 했다,
학생 신분에서 갑자기 회사 말단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여서 어리둥절한 데 말단 직원이라 닥치는 대로 일을 시켜 말 못할 서러움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억울하고 외로왔던 인고의 세월을 잘 참아더니 차츰 시간도 금전도 여유가 생기며 주위를 둘러볼 수 있었다.
내 눈에 멋진 남자친구, 지금의 남편이 생겨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가게 되였는 데 시간을 맞추다 보니 여름에 가게 됐다.
몇년 동안 산동말만 듣다가 역전에 내리면서부터 갑자기 억양이 큰 동북말이 왕왕 고막을 후려쳐서 아찔한 느낌이 들었다.
넓게만 느껴졌던 동구 앞 큰길이 겨우 2차선 비 포장도로였다는 게 허무했다. 그래도 뻐스 타고 들어가는 길 옆의 넓은 논뙈기들과 끝이 보이지 않는 옥수수 밭은 여전해서 반가웠다.
소낙비 올 때면 일부러 커다란 아버지의 비옷을 입고 목 높은 장화를 챙겨 신고 불어나는 도랑물을 구경하면서 넓게만 기억되던 동네 옆 개울이 몇메터 안됐다는 게 의심스러워 보고 또 보기도 했다.
아들 평이를 데리고 고향에 설 쇠러 갔던 겨울, 기억 속에 눈 쌓인 지붕, 앞마당 한켠의 커다란 김치움에서 꺼낸 쨍~한 김치맛, 싱싱한 무우며 생배추, 그냥 밖에 놓기만 하면 랭동보관되는 설음식들.,,생각했던 그대로였다.
집집마다 땔감으로 지붕보다 높이 쌓아올렷던 짚더미는 어디론가 없어지고 대신 조그만 석탄무지들이 마당 한켠에 얌전하게 있었다. 화재 위험 때문에 짚을 마을 안에 놔두지 못해서 바꿨단다.
끼니마다 불을 지펴야 하는 아궁이, 하수도 없이 구정물도 밖에 버려야 하는 번거로움, 화장실 한번 다녀올 때마다 온몸이 얼어드는 수고스러움, 빨래도 뻣뻣하게 얼어가면서 말려지는 고향의 겨울, 며칠만에 다시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여기 엄마집이 아닌, 먼 산동에 있는 내집이 벌써 생각났다.
몇년 후에 부모님들도 내가 사는 동네로 오셔서 같이 지내다 보니 고향에 더는 갈 일이 없게 되였다.
그렇게 십몇년을 고향에 다시 가지 않았다. 외지에 새로운 삶의 둥지를 튼 후 몇번 가보지 않은 고향이지만 가슴 속 깊이 고이 간직하고 있던 달콤함도 현실적 불편했던 기억 때문인지 점점 희미해진다.
타향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이젠 점점 더 정이 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길들여진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사는 데 참 편해진 내 집이 있는 여기가 출장해서도 한시 바삐 오고 싶어진다.
타향이라는 생각이 안드는 나의 또 다른 고향인 것 같다. 고향은 좋은 기억만 하면서 가슴 깊이 묻어두고 오래된 사진첩처럼 가끔씩 한장한장 꺼내볼 때가 제일 좋은 거 같다. 기억 속에서의 고향은 태여난 곳, 애착이 있는 여기는 현실의 고향이 된 것 같다.
고향도 변하고 나도 변했다.
눈 높이가 달라지고 경력들이 늘어나면서 생각도 시대흐름에 따라 바뀌지만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고향에 대한 향수는 아직도 그대로 있다. 몸은 타향에 있지만 고향이 조금씩 바뀌면서도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게 그래도 좋다.